무엇이 달라진 거지.
이 책을 산 것은, 그리고 읽다가 만 것이 언제인지도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아마 바나나를 처음 알게 된 시점이지 않았을까.
무슨 생각을 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이 정도 것을 가지고 뭘, 시시하다 생각하며 덮어버렸던 것 같다.
그리고 좀 더 심금을 울리는 시 몇 편에 나의 말을 얹으며, 이 진한 삶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 같다.
요즈음 나는 이야기에 대해 많이 생각한다.
이야기에 분명 서툴다.
왜냐하면 이야기는 누군가 상대가 있어야 하고, 상황이 있어야 하고, 내가 무엇인가 행동으로 보여줘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시가 좋았던 이유는 앞 뒤 없이, 그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나, 하나로도 족했기 때문이다.
간혹, 길에 떨어진 돌멩이나, 하늘에 떠 있는 달이나 별, 붉은 흙에서 돋아나는 싹 그 정도라면 감지덕지였다.
그런 내가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아직 다섯살도 채 되지 않은 아이와 같은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구나 절감했다.
세상의 이야기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 없었다는 사실,
시를 읽으면서 나의 세모와 네모를 생각했듯,
요즘은 소설을 읽으면서 세상의 세모와 네모, 세상안에 끼어있는 나의 세모와 네모를 본다.
요시모토 바나나의 <키친>
얼마 전 읽은 <N,P>가 그랬듯 이것 또한 상처받은 사람들이 서로의 영혼을 달래주는 이야기다.
부모를 잃고 유일한 혈육인 할머니 마저 돌아가셔서 홀로 남은 미카케에게
남자이면서 여자인 에리코와 에리코의 아들인 유이치가 손을 내밀어 함께 살게 된다.
(사랑하는 이의 죽음 이후 얼마동안,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삶은 무지막지하게 달라진다.)
요리를 사랑하는 미카케, 그 시간을 보내고 독립하여 푸드어시스트를 하면서 착착 살아간다.
그런데 에리코가 사고로 죽고 홀로남게 된 유이치에게 미카케는 따뜻한 요리를 해주며 함께 그 시간을 보낸다.
물론, 남녀라는 것 때문에 연민으로 무조건 다가갈 수 없는 약간의 브레이크가 걸리긴 하지만,
(연민은 가장 깊은 사랑의 모습이기도 하지.)
그들 사랑은 별 것도 아니었다. 음식을 하고, 나눠먹는 것... 그정도가 ...
세상에 홀로 남은 미카케와 유이치는 밝고 건강하게, 그리고 함께 살아가기로 맹세를 하는 것으로 훈훈한 마무리를 한다.
그래, 얼마전이라면 내가 읽다가 분명 덮었겠다.
이런 이야기는 짜증이 나지, 왜냐면 내게 없을 일이고, 세상에서도 없을 이야기 속에서나 있을, 이야기니까.
어젯밤 갑자기 책꽂이에서 이 책을 꺼내 침대맡에 두었다.
아침에 눈을 뜨자 일어나지도 않고 그대로 이 책을 읽기 시작했다.
(요즘 이 재미가 최고! 잠에서 깨기도 전에 책을 읽는 것, 그럼 하루가 그안으로 들어오는 느낌이다)
아침이라서 그런걸까,
이 훈훈한 이야기가 기분이 좋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상상하는 것, 그것은 꿈을 꾸는 것과 비슷하지 않나...
<N,P>가 그랬듯 <키친>도 그것을 읽는 사람들이 열광한다는 것은 원한다는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다.
나도 이런 게 어딨어 하고 덮었다면,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옆에 두고 만날 수 없다면 차라리 멀리 떠나는 것이 더 낫겠다는 생각으로
될 수 있는 한 멀리 떠나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었을까.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랑이 이루어지던, 이루어지지 않던 그것을 단단히 받아들이고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단단하지 못한 나의 문제이다.
나는 <키친>을 읽으면서, 그때보다 나아진 나를 보았기 때문에 만족한다.
<키친>이 보여주는 세상도 이제는 견딜만하다.
내게 그런 세상-인생 최대의 시련을 맞은 시기에 이루어지는 적절한 만남-이, 그런 환상적인 만남이 없을지라도
그것에 대한 질투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니들은 좋겠다 하고 웃으면서
좋은 풍경이라고 감상할 수 있었다.
그래서 만족한다.
<키친>
손발이 오그라드는 요시모토 바나나.
------------------------------------------------
<키친>의 뒤에 수록된 또 하나의 단편 <달빛 그림자>
그리고 침묵이 찾아왔다. 물소리만 콸콸 울리는 가운데, 우라라와 나란히 건너편 강기슭을 바라보고 있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다리가 떨렸다. 조금씩, 날이 밝아온다. 파란 하늘이 물색으로 변하고, 재재거리는 새소리가 조금씩 커진다.
나는, 귓속으로 희미하게 어떤 소리를 들은 것 같았다. 흠칫 놀라 옆을 보니 우라라는 없었다. 강과, 나와, 하늘과-그리고 바람과 강물 소리에 섞여, 귀에 익은 반가운 소리가 들렸다.
방울, 틀림없다, 그럿은 히토시의 방울 소리였다. 딸랑딸랑, 아무도 없는 그 공간으로 방울소리가 울렸다. 나는 눈을 감고 바람 속에서 그 소리를 확인하였다. 그리하여 눈을 뜨고 강 건너 보았을 때, 요 두 달 사이의 그 어느 때보다 심하게 자신이 미쳤다고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터져나오는 외침을 억지로 참았다.
히토시가 있었다.
강 건너, 꿈이나 광기가 아니라면, 이쪽을 향하고 서 있는 사람은 틀림없이 히토시였다. 강을 끼고-그리움이 북받쳐오르고, 그 모습 전체가 마음 속에 있는 추억의 초상과 초점을 맞춘다.
그는 파르스름한 새벽 안개 속에서, 이쪽을 보고 있었다. 내가 엉뚱한 짓을 저질렀을 때 흔히 짓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주머니에 손을 찔러넣은 채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다. 나는 그 가슴 속에서 지낸 시간들을 가깝고도 멀리 느꼈다. 우리는 그저 쳐다만 보았다. 둘을 가로막는 그 격렬한 흐름을, 그 먼 거리를, 사그라드는 달을 지켜보고 있었다. 내 머리칼과, 그리운 히토시의 셔츠깃이 강바람에 꿈처럼 살랑살랑 흩날렸다.
히토시, 나랑 얘기하고 싶어> 나는 히토시랑 얘기가 하고 싶어. 곁에 있고 싶고, 껴안고 재회를 기뻐하고 싶어. 하지만 하지만-눈물이 넘쳐 흘렀다. - 운명은 이미, 나와 너를, 이렇게 강의 이편과 저편으로 갈라놓고 말았고, 나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나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보고 있을 수 밖에 없다. 히토시도 슬픈 눈동자로 나를 쳐다본다. 시간이 멈추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새벽 첫 빛이 자상을 비췄을 때 모든 것은 천천히 희미해져 갔다. 보고 잇는 내 눈앞에서 히토시가 멀어진다. 내가 당황하자, 히토시가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몇 번이나 몇 번이나 손을 흔들었다. 파란 어둠 속으로 사라져간다. 나도 손을 흔들었다. 그리운 히토시, 그 사랑스런 어깨와 가슴선 모든 것을 내 눈 안에 각인하고 싶었다. 그 어슴푸레한 풍경도, 뺨을 타고 내리는 뜨거운 눈물도, 그 모든 것을 기억에 새기고 싶다고 바랐다. 그의 가슴선이 잔상으로 공중에 비친다. 그는 천천히 엷어지고, 그리고 사라졌다. 눈물 속에서 나는 사라지는 그를 쳐다보았다.
완전히 보이지 않자,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갔다. 아침의 다리. 옆에 우라라가 서 있었다. 살이라도 에어내는 것처럼 슬픈 눈동자로.
"봤어요?"
"봤어요."
눈물을 닦으면서 나는 말했다.
"감격했어요?"
우라라가 내 쪽을 보며 웃었다. 내 마음에도 안심이 번지고,
"감격했어요."
라며 미소를 지었다. 빛이 비치고, 아침이 오는 그 장소에, 둘이 한참이나 서 있었다.
아침부터 문을 여는 도넛 숍에서 뜨거운 커피를 마시면서, 조금은 졸린 눈으로 우라라가 말했다.
"나도, 비정상적으로 죽은 애인과 마지막 작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도시에 왔어요."
"만났어요?"
나는 물었다.
"응"
우라라는 살며시 웃으며 대답했다.
"정말 백 년에 한 번 꼴로, 우연히 겹치고 겹쳐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장소도 시간도 정해져 있지 않죠. 알고 있는 사람들은 칠석현상이라고 해요. 큰 강이 있는 곳에서만 생기죠. 사람에 따라서는 전혀 보이지 않아요. 죽은 사람이 이 세상에 남긴 사념가, 남은 사람의 슬픔이 서로 반응했을 때 아지랑이가 되어 보이는 거예요. 나도 처음 봤죠. ...... 사츠키 씨는 아주 운이 좋았어요."
"백년이란 말이죠."
나는 그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낮은 확률을 생각했다.
---189P-190P
....
'읽는대로 小說'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윤후명] 사랑의 방법 (0) | 2011.07.05 |
|---|---|
| [배수아] 올빼미 없음 (0) | 2010.07.25 |
| [무라카미 하루키] TV 피플 (0) | 2010.07.10 |
| [요시모토 바나나] N. P (0) | 2010.07.04 |
| [김혜나] 제리 (0) | 2010.06.2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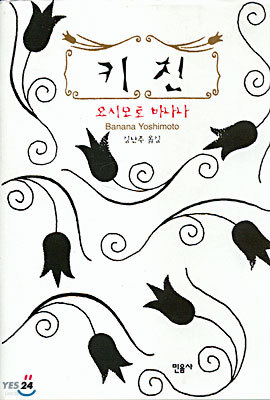


댓글